안녕하세요 해람 연구회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와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목차
정신과적 진단은 다른 과 진단과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과적 진단은 내과, 외과 등 다른 과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의학적 진단은 주로 혈액 검사, X-ray, MRI 등의 검사를 기반으로 검사의 수치 혹은 영상 판독, 혹은 조직병리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신과의 경우 주관적인 증상과 관찰을 기반으로 면담을 통해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진단에서 혈당 수치나 당화혈색소(HbA1c)검사를 보는 것과는 달리, 우울증이나 조현병, 불안 장애의 진단은 혈액 검사나 영상검사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으며, 환자가 직접 보고한 감정과 행동,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과의 진단은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진단 기준에 의거한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크게 의존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어떤 것을 진단에 참고하나요?
정신과 의사마다 같은 환자를 다르게 표현하거나, 다르게 진단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진단 및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과 <국제질병분류(ICD)>와 같은 진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루는 ICD와는 달리, DSM은 미국 정신의학회(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출판하는 서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각종 정신질환의 정의 및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DSM에서는 각 질환의 특징적 증상을 기준으로 기간, 심각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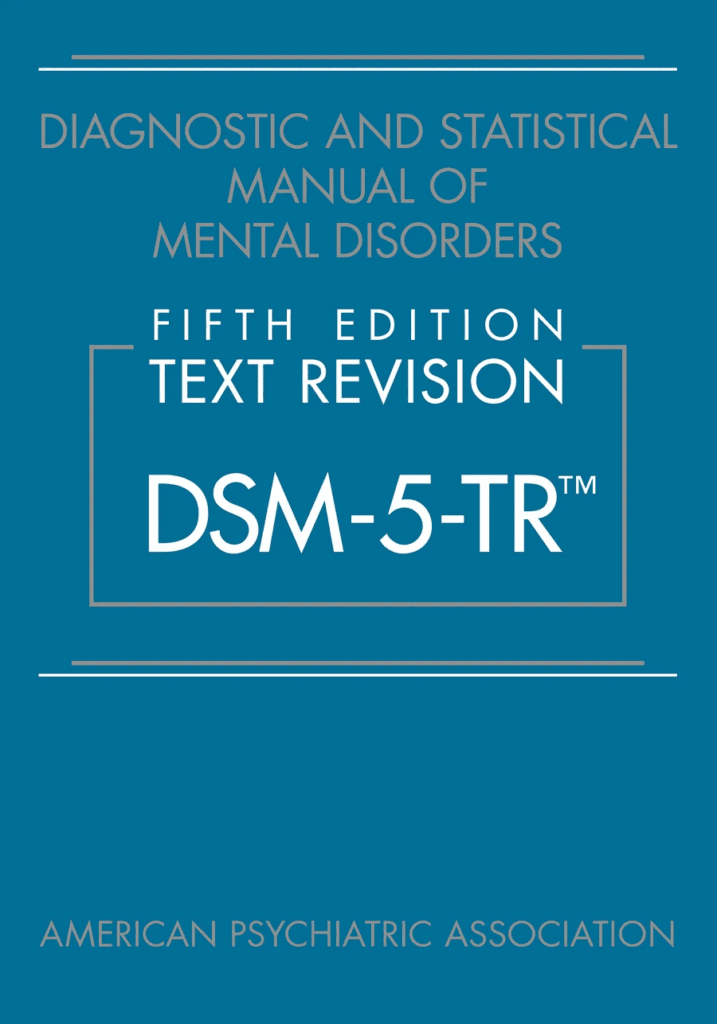
정신과 질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DSM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한 개정과 업데이트를 하며 수정/보완을 거쳐 왔는데, DSM-I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DSM-V-TR(Text Revision)까지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던 진단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진단이 생기기도 하고, 따로 분류되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트랜스젠더 (Transgender)에 대한 DSM의 시각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980년 DSM-III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성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이름으로 진단했으며, 이는 성별 불일치감 자체를 병리적 상태로 분류하는 진단명이었습니다. 이런 진단명은 트랜스젠더를 스스로의 성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애(Disorder)’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 낙인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의학적 낙인이라 함은, 트랜스 남성(FTM)인 사람이 스스로는 트랜스 남성으로의 삶을 살면서 겪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정신과에 가서 이야기하고 치료받는 것을 원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트랜스 남성이 스스로의 성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고, ‘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치료부터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의학계는 점차 트랜스젠더의 심리적 고통이 정체성 자체보다는 성별 불일치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13년 DSM-V에서 본격화되었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 정체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der)라는 용어 대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명은 성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에 집중하며, 이로써 정체성 자체를 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DSM-III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진단명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변화를 통해 트랜스젠더들이 느끼는 고통이 정체성 자체에 있지 않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트랜스 여성이 자신의 성별과 다른 신체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정신의학적으로 그녀를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환자’로 보는 대신, ‘성별 불쾌감을 겪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고, 불쾌감 자체에 대해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접근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더 공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 여성(MTF)는 내과 의사에게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 기복 등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로, 트랜스젠더 여성 배우 라버른 콕스(Laverne Cox)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들의 성별이 아니라,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버른 콕스의 인터뷰와 연설은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성 정체성’ 자체가 문제로 여겨졌지만, 현대 정신의학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통을 성 정체성 자체의 문제가 아닌 ‘성별 불일치’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심리적인 어려움 자체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람 정신건강 연구회 입니다 정신과와 심리학,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정신과 전문의가 전달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test.hearam.kr 에서는 간단한 심리검사를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람 연구회 최신글 보기 !